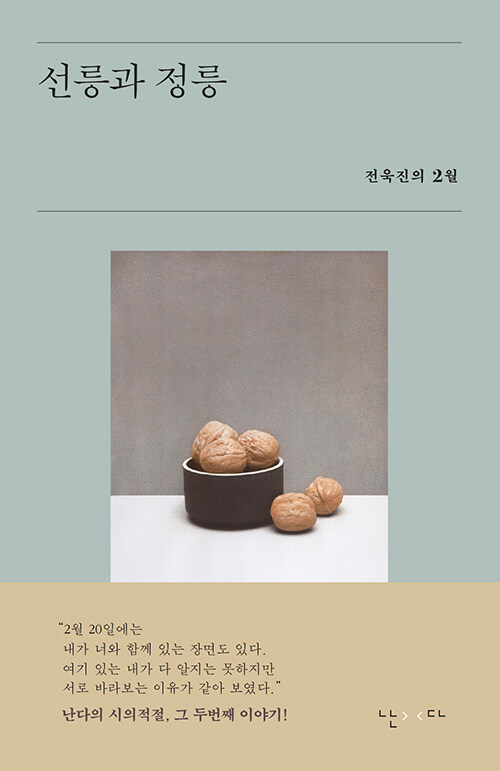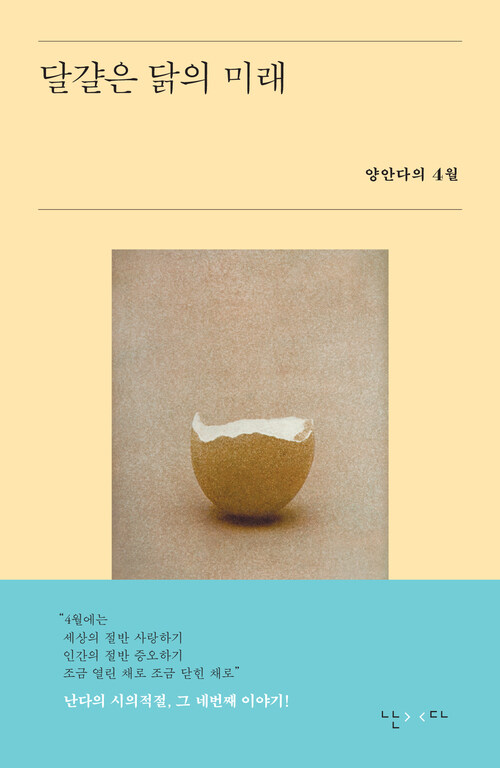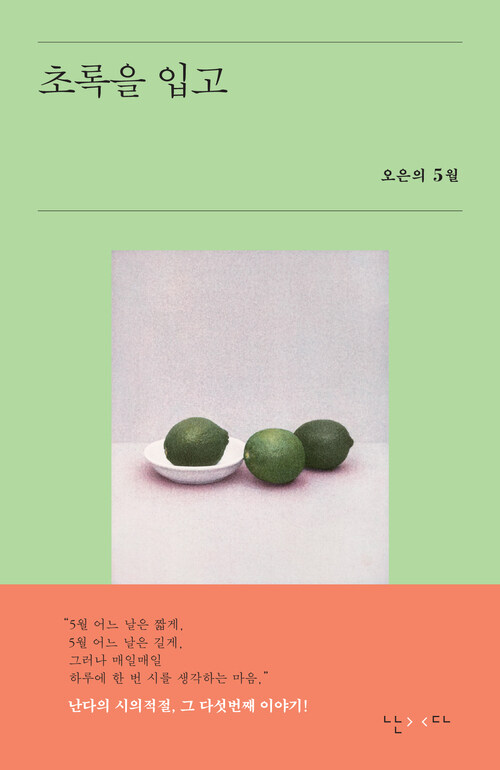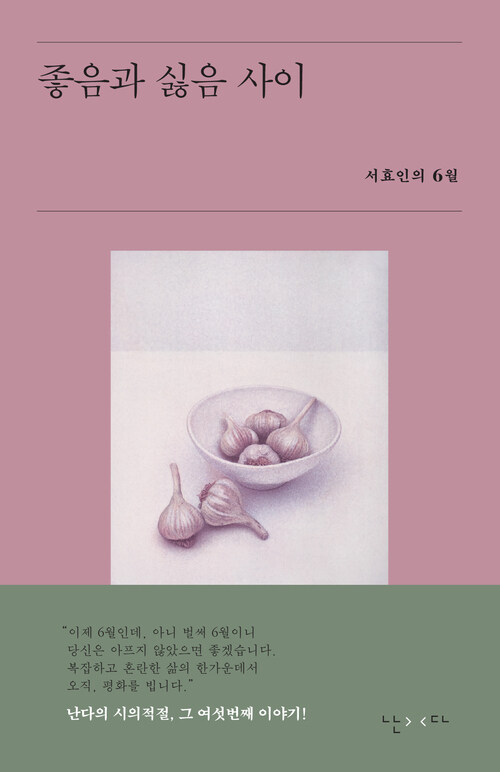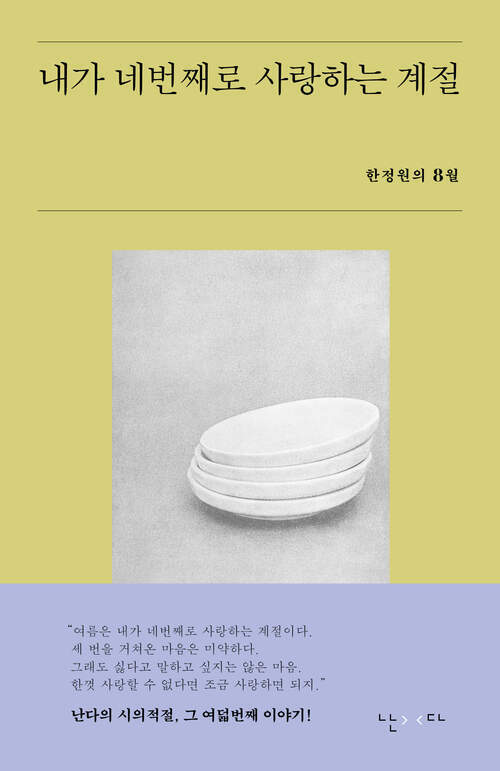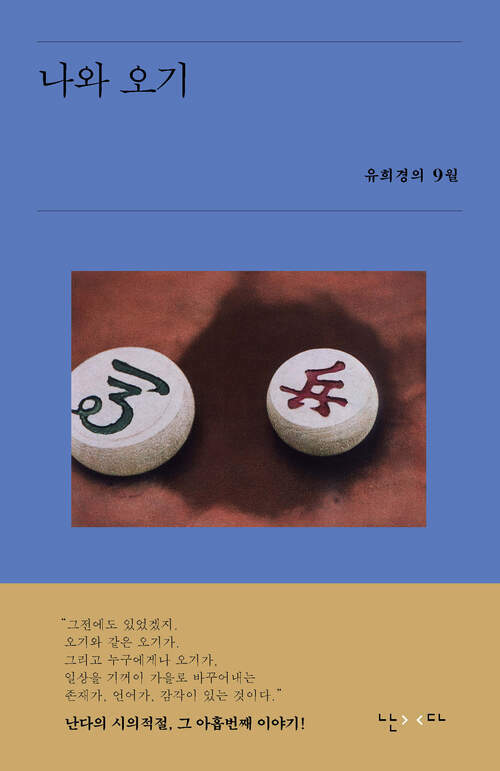매일 한 편, 매달 한 권,
1년 365가지의 이야기
<시의적절> 시리즈
시(詩)의 적절함으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열두 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나가는 열두 권의 책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열두 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나가는 열두 권의 책
2024 라인업
-
1월 김민정 / 2월 전욱진 / 3월 신이인 / 4월 양안다 / 5월 오은 / 6월 서효인 / 7월 황인찬 / 8월 한정원 / 9월 유희경 / 10월 임유영 / 11월 이원 / 12월 김복희
시의적절 12월
<오늘부터 일일> eBook 단독 판매
난다 '시의적절' 시리즈 12월, 김복희 시인의 <오늘부터 일일> 기대평을 남겨 주세요. 추첨을 통해 30분께 전자책 전용 적립금 1천원을 드립니다.
1,000
댓글 남기러 가기
꼭 읽어주세요!
- 이벤트 기간 : 2024년 12월 26일 ~ 2025년 1월 8일
- 당첨자 발표 : 2025년 1월 15일 (7일간 사용 가능)
- 한 사람 당 하나의 아이디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는 예고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시의적절 1월
읽을, 거리
김민정 | 난다
시인 김민정이 매일매일 그러모은 ‘1’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서른한 편의 글로 책 한 권을 꾸렸습니다. 1월 1일엔 짧은 일기를 옮깁니다. 1월 3일엔 그리운 이와의 대화를 담고 1월 7일엔 시를 씁니다. 시, 일기, 에세이, 인터뷰…. 한 달이라는 ‘1’ 안에 이토록 다양한 글이 있구나 합니다. 이토록 다채로움 속에 단단한 기둥 하나, 언제나 시라는 ‘1’ 있구나 합니다. ‘1’ 숫자는 가벼이 휙 긋고요, 그 틈으로 비어져 나오는 읽는 이의 시, 나만의 시로 남은 하루 채우면 됩니다.
시의적절 2월
선릉과 정릉
전욱진 | 난다
시인 전욱진의 사랑처럼 흐르는 '2월'
‘2’라는 숫자는 참 이상하지요. 둘이라서 다정인데 둘이라서 하나는 아닌, 그 ‘따로’라는 거리. 『선릉과 정릉』, 두 개의 능(陵) 나란히 세워놓은 제목 속에도 ‘양지바른 무덤’, 그 밝음과 어둠 묘한 거리로 남은 듯하고요.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둘이라는 것, 2라는 것은 사랑이 아닐 리 없다고요.
시의적절 3월
이듬해 봄
신이인 | 난다
시인 신이인의 비밀의 정원 같은 '3월'
다 가버린 봄 아니라 다가오는 봄이라서 <이듬해 봄>. 수풀 헤치면 작은 오두막이 있는 시인의 뒤뜰로 초대합니다. 다듬어 꽃 장식 가득한, 초록 돋고 들꽃 피고 개구리 울음 가득한. “너에게만 주는 거야” 말하고 쥐여주는 특별한 선물도 있고요, 알맹이가 시트 사이로 꽉꽉 들어찬 딸기 케이크도 있을 테지요. 새봄을 시작하는 우리 가방마다 요 초대장 넣어두었으니, 꼭 한번 펼쳐봐주시기를요.
시의적절 4월
달걀은 닭의 미래
양안다 | 난다
시인 양안다가 미리 살아낸 '4월'
꽃피는 4월, 봄의 한가운데지만 마냥 화사하고 화창한 날들만은 아니겠지요. 하루만큼은 작은 거짓말도 용서받는 만우절, 나무 대신 마음을 심어도 좋을 식목일, 그리고 무엇보다 잊히지 않을, 4월 16일. 표지의 색을 골라볼 적에 이 노란색 말고는 달리 떠올릴 수 없었던 연유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달걀이 닭의 미래여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인이 택한 자리란 ‘깨진 달걀’들의 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진 달걀들의 곁으로, 기꺼이 불안의 편으로, 그리하여 마땅한 미래로, 걸음 떼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의적절 5월
초록을 입고
오은 | 난다
5월의 녹음처럼 울창한 말의 세계
새록새록 혹은 초록초록, 움트고 흐드러지는 5월. 누구보다 읽고 쓰는 일에 진심인 시인 오은의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달력에 매김 하듯 서른한 편의 글을 꼭꼭 눌러 담았다. 시의 씨앗부터 단어라는 잎, 글로 피운 꽃까지. 읽는 내내 우리의 5월 또한 초록으로 물들듯 푸릇해진다면 좋을 테다.
시의적절 6월
좋음과 싫음 사이
서효인 | 난다
한 해의 절반인 6월, 인생의 중턱에서
6월, 올라온 길과 올라야 할 거리를 가늠하기에 시의적절한 때. 마흔 넘어 아마도 인생의 절반, 한 시인이 돌아보며 내다보는 삶의 궤적을 서른 편의 글에 담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혹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 절반 담긴 잔 앞에서, 물 대신 흔들리는 것 아무래도 마음이고 삶입니다. 다만 좋지만도 싫지만도 않은 삶의 가운데, 시인을 따라 지난 절반과 앞으로의 절반, 두 손바닥 반씩 모아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시의적절 7월
잠시 작게 고백하는 사람
황인찬 | 난다
7월, 여름의 무성함을 닮은 '시'
언제나 시를 생각하지만 시가 무엇인지 답하기 직전에 멈추는 사람. 자주 지나간 실패를 뒤적이고 미리 다가올 낙담을 쥐어두는 사람. 시인 스스로는 이를 두고 ‘어중간’과 ‘어정쩡’이라 말하지만, 중간이란 언제나 길 위에 있음을. 그렇게 한 해의 복판, 여름을 손안에서 시작하는 책.
그러나 우리가 여름을 생각하는 일이 꼭 여름 가운데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지요. 여름의 바깥에서, 오히려 멀찍이서, 여름을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진짜 ‘여름’을 시작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를 생각하는 일이 꼭 그러하듯이요.
시의적절 8월
내가 네번째로 사랑하는 계절
한정원 | 난다
8월, 여름의 흔적으로 향하는 시선
여름을 지나, 여름을 기억하며, 다만 코끝에 귓가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여름의 흔적을 더듬는 일. 오래도록 어루만지는 일. 그리하여 이제 가벼이 일어서, 흐르는 계절의 뒤를 조용히 따라 걸을 그런 책.
햇볕 뒤편의 나무 그늘, 여름비가 고여든 웅덩이, 침묵으로 향하는 종소리 같은 것.
시의적절 9월
나와 오기
유희경 | 난다
오기를 기다리는, 9월
“어느덧 9월이다. 나는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기가 오지 않는다 해서 가을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오기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나의 가을은 달라진다. 오기를 만나기 전의 9월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전에도 있었겠지. 오기와 같은 오기가.” 9월 한 달 따라 읽다보면 가을이 성큼일 테다. 가을을, 가을의 오기를,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마다의 오기, 누구나의 오기, 세상 모든 오기를 기다리며.
시의적절 10월
핸드백에 술을 숨긴 적이 있다
임유영 | 난다
책을 펼치자니 10월을 닮은 냄새
“다음 시집에선 보이지 않는 것들, 안 보이면서도 확실히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 냄새, 기운, 공기, 느낌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 만약 이 책에서 술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나는 냄새다. 10월의 냄새다.” 시와 에세이는 물론 관람 후기와 메모 등을 경유하며 사진, 회화, 음악, 영화까지 예술 전반을 ‘유영’하는 이야기. 즉, 삶에 예술을 푹 담글 때 거기서 무르익는 것이 ‘시’임을, 그리하여 삶이란 어떤 취기임을.
시의적절 11월
물끄러미
이원 | 난다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
“늦가을 햇빛, 낙엽, 어둠, 초겨울 불빛, 물빛, 적멸. 얼핏 서늘하고 스산하다 느낄 수 있지만, 11월에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어요.” 조금은 서늘하고 그러나 시리지만은 않은 계절, 시인은 그 사이의 말들에서 고요한 기도를, "모르는 아름다움"을 본다. 다른 존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일. 놓치지 않되 억압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지만 거두지 않는 시선. 모두 '물끄러미'의 자세로야 가능한 일이다.